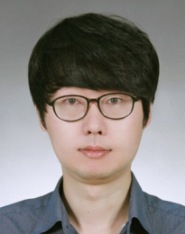고전산책에 올려진 재미 있는 글을 옮깁니다.
거북이의 운명
| |||
어떻게 보면 꽤나 능청스러운 글이다. 거북이의 운명을 말하는 저자의 이름 ‘귀명(龜命)’ 이 글자 그대로 ‘거북이의 운명’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조귀명 자신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꽤나 의미심장한 글이기도 하다.
고대 중국에서는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거북이 등껍질로 점을 쳤다. 등껍질은 불에 구우면 갈라지면서 무늬를 만든다. 이 무늬를 해독하여 앞날을 예측했고 그 내용을 등껍질에 글로 새겼다. 거북이점은 천자와 제후만이 칠 수 있었고, 하늘의 신탁이 적힌 등껍질은 신성한 보물로 여겨졌다.
시대가 변해 거북점을 치는 풍습이 사라졌다. 거북이는 더 이상 사람에게 붙잡혀 등껍질이 구워지는 고통을 겪지 않고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다가 천수를 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옛날의 관념은 살아남아 사람들은 거북이를 계속 신령한 동물로 여겼다. 속된 말로 ‘거북이 팔자가 상팔자’라 할 만했다.
지금의 거북이와 옛날의 거북이는 다르다. 옛날의 거북이는 공자를 닮았다. 공자는 살아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유랑 생활을 했다. 그러나 죽은 뒤에 사람들은 그의 저술과 어록에 남겨진 사상을 내면적 규범이자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받아들였고 그를 만세의 스승이자 성인으로 추앙했다.
조귀명은 과거에 낙제한 뒤로 벼슬할 생각을 버리고 사람들과의 교유도 끊은 채 깨끗하고 조용한 방에서 홀로 지냈다. 이따금 물소리를 들으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기도 했다. 세상에 쓰이지 않은 채 속세를 벗어나 초연하게 살아간다는 점에서 지금 시대의 거북이를 닮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었다. 조귀명은 예술가였다. 자신의 작품에 있어서 만큼은 결코 초연하지 못했다.
조귀명은 어려서부터 문장에 재능을 보였다. 좋은 글을 쓰겠다는 의지도 강했다. 시대가 변했는데도 사람들은 지금 시대에 맞는 글을 쓰기보다 옛사람들이 한 말을 짜깁기하여 글을 짓기 바빴다. 문장에 전념하는 것을 잡기에 정신이 팔렸다고 폄하하기도 했다. 조귀명은 당시의 이런 풍조에 반발했다. 자신만의 사유를 자신만의 스타일에 담아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성공했다. 그것이 문제가 됐다.
그의 사상은 당시 철저한 성리학 중심의 학계 풍토에서 이단시 되던 노장(老莊)과 불교를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개성을 중시하여 독특하고 때로는 난해하기까지 한 그의 스타일과 감성은 유가 이념을 근간으로 단정하고 품격 있는 문장을 추구했던 문단의 주류를 불편하게 했다. 그의 재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됐다. 그렇게 여겨졌다. 그의 답안지를 채점했던 과거 시험관은 장원으로 뽑아야 한다는 동료의 주장을 무시하고 그를 낙제시켰다. 자신의 작품을 정리하여 문집을 만들고 친구이자 당대의 이름난 문장가였던 황경원(黃景源), 남유용(南有容), 이천보(李天輔)에게 서문을 써달라고 부탁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같은 이유였다. 그런 시대였다.
1736년 44세 되던 해에 조귀명은 이 글을 썼다. 거북이의 운명을 말했다. 1년 후 세상을 떠났다. 1741년 재종형 조현명(趙顯命)이 그의 문집을 간행했다. 서문은 없었다. 1752년 황경원이 문집을 다시 간행했다. 여전히 서문은 없었다. 1773년 영조가 짧은 서문을 써 주었다. 그러나 그의 문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영조가 세제(世弟)일 때 있었던 두 사람의 짧은 만남, 총애하던 조문명(趙文命), 조현명의 친척 동생이자 이천보의 친구라는 사실만 비중 있게 언급됐다.
지금의 거북이와 옛날의 거북이는 다르다. 각자의 시대에 맞게 살고 죽는다. 그러나 신령한 동물로 여겨진다는 점은 같다. 조귀명의 바람도 이런 것이었다. 공자의 시대는 조귀명의 시대와 다르다. 공자와 조귀명은 다른 사람이다.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다면 글도 달라야 한다. 조귀명은 다른 글을 썼다. 그러나 당시의 세상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죽은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거북이가 되지 못했다. 거북이가 좋은 운명을 부여받았다는 조귀명의 마지막 말은 이름과는 다른 현실에 대한 자조이자 결국 이루지 못할 꿈에 대한 기원이었을 것이다. |
|
'역사속으로 > 이야기한마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이완용과 의사 (0) | 2018.09.14 |
|---|---|
| [스크랩] 저주 그리고 666에 관한 수비학적 의미 (0) | 2018.08.26 |
| [스크랩] 사주학과 운명학 (0) | 2018.08.12 |
| 인생 한마디 (0) | 2018.08.01 |
| [스크랩] 미구니들의 (0) | 2018.06.16 |